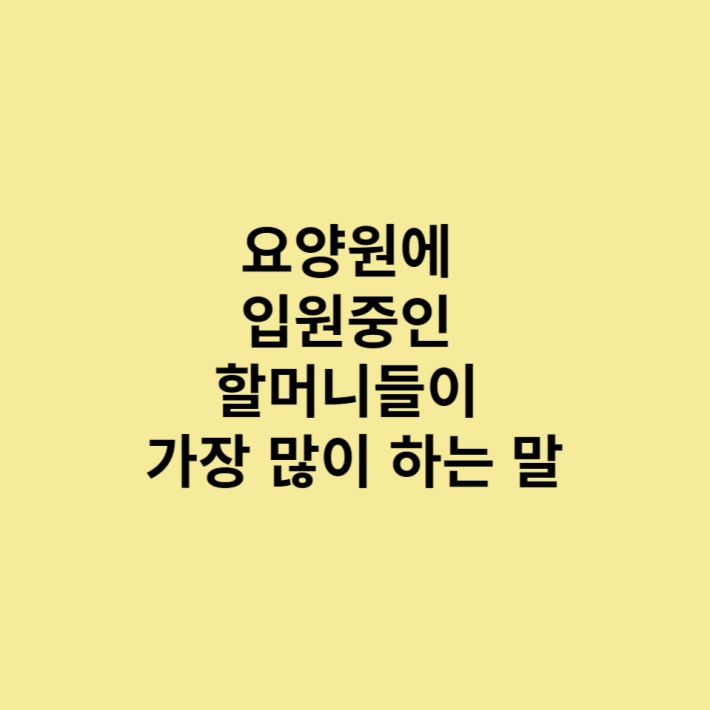
월간잡지 신동아 2023년 6월호 목차를 펼쳐보다가 눈에 띄는 제목을 하나 발견했다.
최은숙 작가의 에세이로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다.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실지 궁금한 생각이 밀려왔다.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 작가와 나의 이야기를 적어본다.
요양원 입원 중인 할머니들이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이유
작가 이야기의 시작
잘 알고 지내는 동네 언니가 요양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언니와 만나면 요양원에서 있었던 이런 저련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요양원하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요양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도시 한복판에 자리 잡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식들 오기가 편리해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어떤 것이 행복한 노후일까. 요양원 창문에 붙어있는 "행복한 노후"라는 글씨가 참으로 무심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나의 지난 이야기
오랜 전 아버지는 집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다. 시골 넓은 마당이 장례식장이요, 안방에서 수의를 입히고 입관 후 안치소였다. 그 후 장모님, 어머니, 장인 순서로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렀다.
어머니는 농번기인 시골에서 하루종일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무료하셨는지 요양원을 보내달라고 만날 때마다 말씀하셨다. 당신 말씀대로 요양보호등급을 받고 요양원으로 들어가셨다.
장인도 처형집에서 함께 사시다가 요양원을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다. 모두 요양원에서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 요즘은 자의든 타의든 요양원을 가게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는다.
어머니와 장인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코로나19로 요양원 대면이 안되던 시기에 돌아가셨다. 요양원에 누워있는 마음이 어땠는지 전혀 눈치챌 수가 없다.
약간 치매 증세가 있었던 어머니는 스스로 선택하셔서 그런지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장인은 집으로 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어서 그런지, 작가의 에세이 제목을 주의 깊게 읽기 시작했다.
요양원 입원 중인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요양원에 치매 걸린 할머니들이 정말 많아, 그런 할머니들이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실 거 같아?” 야간 근무를 마치고 나온 언니가 물었단다.
“집에 갈 거야”라는 말을 가장 자주 하는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할머니들은 주무셔야 할 시간에 일어나 기저귀, 옷가지 등을 갠 후 홑이불을 보자기 삼아 짐을 싼단다.
“밤이 늦었는데,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으면 대개 집으로 간다고 하셔, 아이들과 남편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야 한다.”라고 대답하신다.
“할머니 한 분은 정신이 전혀 없으면서도 반듯하게 맞춰서 보따리를 참 예쁘게 싸 놓으셨지. 평생 살림살이 하나 흩트려 놓지 않고 사셨을 분 같았어.”
지금은 밤이 깊었으니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가셔야 한다고 알려드리면 할머니들 대부분이 침대로 돌아간다고 했다.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집으로 가고 싶어 하실까.
작가도 자신도 할머니들이 집이 그리워서 그러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밥, 밥 때문이었어. 아이들도 먹이고, 남편도 먹여야 한다고, 밥을 하러 집에 가야 한다는 거야.”
작가는 그 대목에서 눈물이 울컥 났다고 한다. 글을 읽는 도중에 눈물이 고였다.
평생 동안 때를 맞춰 얼마나 많은 밥을 해주며 살아왔는가. 치매에 걸린 이 순간에도 할머니는 밥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리베카 솔닛은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자신의 엄마를 보면서 ‘드문드문 페이지가 찢겨 나간 책’ 같다고 표현했다.(‘멀고도 가까운’ 반비, 2016)
치매 할머니들의 기억은 드문드문 찢겨 나간 것이 아니라 아예 후반부 이야기 전체가 사라진 책 같은 것은 아닐까?
집에 밥 하러 간다고 보따리를 싸는 할머니의 기억 속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지고 있을까. 어린 자녀들과 젊은 남편이 오손도손 밥상에 둘러앉아 즐겁게 밥을 먹던 시간 여행을 하고는 있는 걸까.
치매를 앓는 할아버지들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출근해야 한다면 가방을 챙기고 일어서지는 않을까. 평생을 밥하고 일하고 살아온 삶의 마지막을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이 아닌 시끄러운 도시의 숲에서 맞는 현실이 서글퍼지게 느껴진다.
작가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살아계신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다. “알겠다. 나는 다 괜찮으니 너희나 조심해서 다녀라, 고맙다.”
이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어렴풋이 이해한다. 자신도 그때로 점점 가까워져 간다. 그러면 자녀 앞에서 나 자신도 그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다 괜찮으니..."
부모님 모두 돌아가신 지금, 다음은 내 차례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요양원을 자주 방문하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요양원을 다녀 가는 것도 버겁게 느껴진 때가 있었다. 내 일 보느라 바쁘게 시간이 지났다.
가끔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면, 건강,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자녀 이야기를 한다. 모두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이다. 모두 개인과 가족의 처한 환경이 다르다.
P선배는 90세가 훨씬 넘은 장인이 혼자 사신다고 한다. K친구는 어머니가 거동을 못하셔서 집에서 누나가 대소변을 받아낸다고 한다.
G친구 장모님은 10년째 요양원에서 누워계신다고 한다. A친구는 어머니처럼 약한 치매를 앓으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카페만큼이나 노인요양원, 요양병원, 주간보호센터 간판이 많이 보인다.
어떤 공원묘지 입구에 "다음은 네 차례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다음은 내 차례가 되었다.
"요양원 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에세이를 읽으며, 흘러간 지난 세월을 생생하게 되돌려 봤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하게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는 날을 기대한다.
▶[아름다운 여행] - 한국족보박물관, 뿌리를 향한 그리움
'또다른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정화의 대상은 자연이 아니라 인간 (89) | 2023.07.05 |
|---|---|
| 대전 유등천 맹꽁이 서식지, 호우경보 속 울리는 합창 소리 (16) | 2023.07.05 |
| 계족산 장동산림욕장 길목, 누렇게 익어가는 보리밭 (58) | 2023.05.31 |
| 서해 수호의 날을 맞이하는 대전국립현충원 (46) | 2023.03.22 |
| 한남대 캠퍼스 내 오정동 선교사촌 (46) | 2023.03.08 |




댓글